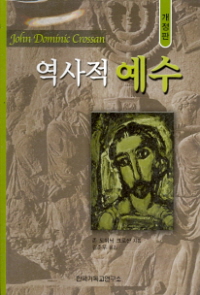일주일에 한번씩 온라인 화상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앓고 있는 아픔이 이어지는 한, 우리라도 그들을 잊지말고 그 아픔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보자고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모일 때마다 작은 주제를 정해놓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곤 합니다. 지난 주에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왜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한국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왜 이민와 살면서 떠나온 모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미국에 온 햇수도 다르고 이제껏 살아온 경험들도 서로 다르거니와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정주부로 자녀교육에 열심인 친구도 있으니 저마다 다른 생각들이 있었답니다.
그날 모임은 일테면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들이 왜 모여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나눈 이야기들을 전파할 수 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늘 그렇듯 모임이 끝나면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롭게 눈뜨는 것들로해서 이 나이에 과한 즐거움을 얻는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과 주초에 제가 경험한 일 때문에 이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른바 SNS라는 신종 대화 도구들이 있습니다.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카톡, 텔레그램 등등이 그것들이지요. 저는 제 또래 남못지않게 이런 신종 도구들을 먼저 사용해보는 왈 얼리어답터에 속하는 편입니다. 모든지 처음 나왔다하면 찝적거려보기는 하는 편이랍니다. 그런데 즐기는 쪽으로 접어들면 완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쪽이랍니다.
일테면 저는 제 소유의 셀폰(핸드폰, 스마트폰 무어라고 부르던간에)이 없습니다. 그저 PC와tablet을 가지고 놀 뿐입니다.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삽니다. 폰을 손이나 핸드백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사는 아내를 보면 이따금 “왜 저럴까?”하는 생각을 하곤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더러 “촌스럼의 극치로 산다”고 말한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랍니다. 트위터에서 누군가를 팔로잉한다든가 페북에서 친구맺기를 신청한다든가, 댓글을 단다든가 하는 일에는 거의 쑥맥에 가까운 촌스러움이 있답니다. 그저 수줍게 제 이야기를 올리고 그것으로 족한 편이지요. 당연히 팔로윙이니 팔로워니, 친구숫자니 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편이랍니다.
그러니 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할 뿐이지 골방에서 제 이야기를 혼자 떠드는 수준에 불과한 진짜 촌스러움의 극치랍니다.
그런 제게 지난 주말과 주초에 댓글로 충고들을 남긴 이들이 있답니다. 한 친구는 지금이라도 만나면 “야~ 쨔샤!”하며 반길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다른 이는 전혀 모르는 어찌 하다보니 페북에서 만난 분입니다.
제 어릴 적 친구는 현재 한국에 살고, 페북에서 만난 분은 미국에 사시는 이입니다.
먼저 헤어져 만나지 거의 40년이 넘는 제 어릴적 친구의 충고는 “떠났으면 지금 사는 곳의 삶에 충실하길 바란다. 여긴 사는 우리들이 꾸려나갈 것이므로…”하는 것이였는데, 그 충고를 남긴 시간과 그 친구가 누리고 있었던 형편으로 미루어 오랜 옛 벗인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그리 멀리 않은 곳에서 사는 페북에서 알게된 이의 충고는 “차라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게 좋겠다”는 것이었는데 사뭇 성난 투의 말이었답니다.
두 사람 다 제가 페북에 올린 한국관련 이야기들에 대한 반응들이었지요.
그래 저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랍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받은 이메일 몇 개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You’re welcome. I’m glad you are here, and doing what you do, too. Very interesting article — research which reinforced my observations / perceptions in a few of the listed occupations. >
<Mr. Kim,
Thanks for your note. It reminded me of the African-American slaves, when the children and spouses were sold and they knew, chances were, they would not see each other again. My Dad told me of stories where slaves who were able to escape to the north, who spent the rest of their days trying to find out where their kin lived and to reconnect. Some stories ended right and others ended very sad. To this day I cannot trace my family back to the slavery days. However, my wife Mae can trace her descendants back to Nova Scotia, Canada and the slave ship that brought the family to Halifax from Jamestown, VA.
I always enjoy your notes: they make us think!>
<Mr. Kim,
I really like your note. I hope you are right about the move to the “HANGRY” Generation . I see the “me first” in our national politics. Maybe that will change as the younger generation influences.>
<Dear Young Kim,
Thank you for another delightful letter from My Cleaners. I agree the world is full of very diverse people with lots of differing attitudes and beliefs. Your reminder to be open to others comes at a perfect time. Well, any day would be the perfect time, wouldn’t it?
What transpires at your counter, everyday, is a wonderful example of openness and willingness to come into relationship. One of my teachers would say that we move through a progression in knowing people. We start as Strangers, move to Acquaintances, then to Rapport and finally into Relationship.
Strangers — we know nothing about each other
Acquaintances — we know some facts (name, address, phone number) about each other.
Rapport — we share similar feelings, are harmonious, we can get along
Relationship — we share and understand what to expect from each other, we share mutual expectations.
In my business (dental practice) we used to say, “Never treat a stranger.”
Of course, always started out as Strangers. We easily became Acquaintances with a written intake form which shared the needed data.
Coming into Rapport was more time consuming, requiring some questions and answers, sharing of information, thoughts, feelings, opinions, experiences.
Relationship required a more complete discussion of what we each expected from each other.
Although not everyone wants to be in Relationship with every other person, or even with their healthcare providers, (or cleaners). We all can easily move toward Rapport, starting with just a SMILE. A welcoming, open attitude begins there and moves ahead with words and gestures.
Your “Letter From Your Cleaner” constantly reminds us what we can expect from you. This is an open door for relationship building. What you can expect from me, is to be paid for your service. I also may provide a pleasant attitude, timely retrieval of my clothes, a sincere referral of a friend to your business. Thus, we move into Relationship as we each fulfill our mutual expectations. This is the basis of a trusting, respectful Relationship.
My wardrobe is improved by your cleaning service, and my life is improved by your letter and my spirit is lifted by our relationship.
Yours for a better world,>
제가 이 이민의 땅에서 이곳 사람들에게 받은 이런 종류의 메일은 책으로 엮는다면 족히 몇권 분량은 된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일면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괜찮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지고 싶은 욕망도 있거니와 저로 인해 한국과 한국인들의 좋은 점들이 드러나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민의 삶을 이제껏 가꾸어 나왔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제게 늘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이 손가락질 받고 우스개 노릇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정말 아니랍니다. 그래 한국과 한반도에 대해 제가 관심을 끊지 못하거니와 적극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제가 종북이니 반국가적(반정부라는 말은 그래도 들을만 하답니다.)이니 하는 말을 듣게되면 솔직히 분노가 치민답니다.
사르트르는 <유대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반유대주의란 유대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대인”을 “혐오집단”으로 지목해 그들에 대한 증오없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반유대주의자들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약 유럽의 부르조아들은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만들어 냈을지도 모른다.>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남겼던 때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중동에서는 유대인들이 옛날 유럽인 행세를 하고 있듯이, 같은 한인들끼리 한반도 안에서 그리고 이곳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혐오집단”과 “증오의 대상”을 찾는 못된 관습은 사라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더욱더 미국인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이야기를 끊을 수 없는 까닭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