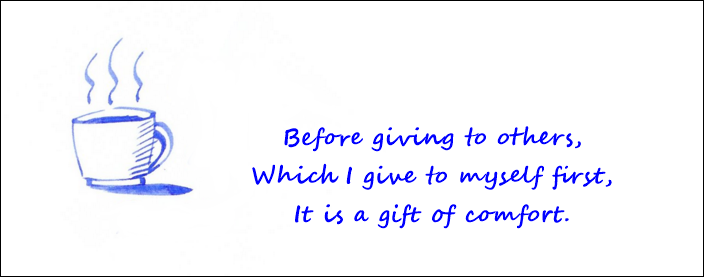해방과 구원은 성서 이야기의 두 핵심이다. 히브리족속의 탈애굽과 예수의 십자가는 두 핵심 이야기를 대변하는 사건들이다. 나머지 무수한 이야기들을 단지 두 핵심 이야기를 위한 치장으로 내칠 수는 없겠다만, 무게가 처짐에는 틀림없다.
예수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십자가와 부활에 닿지않는 예수 탄생 이야기는 큰 뜻이 없다.
<그 분은 그 옛날 호숫가에서 그분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름이 없는, 알지 못하는 분으로 찾아 오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 시대에 그분이 성취하셔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정해 주신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현명한 사람이건 단순한 사람이건 간에, 그분의 제자로 살기 위해 거치게 될 수고와 갈등, 고난 속에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배우게 된다.> –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역사적 예수의 탐구에서)의 말이다.
<예수가, 아마도 처음이자 유일하게, 성전의 화려함에 맞서서 그 합법적 브로커 기능을 브로커 없는 하나님의 나라(unbrokered kingdom of God)의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파괴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시대의 신학자 존 도미닉 크로산(John Dominic Crossan, 역사적 예수에서)이 만난 예수의 모습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전적으로 믿는 이들 개인 신앙고백에 닿아 있듯이, 예수 탄생의 뜻 역시 온 세상 각 사람들과 신이 그 어떤 브로커 없이도 만나는 지점 곧 오늘 여기에서 세워진다.
2018년 성탄 전날 아침에 빌어보는 기도이다. “곤고한 모든 이들의 가슴에 한 점 별빛으로 찾아오소서. 별빛에 크기와 상관없이 오신 당신으로 인해 오늘, 여기에서 누리는 삶의 뜻을 찾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가게 손님들에게 편지를 띄운다.
이제 2017년도 딱 한 주간을 남겨 놓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을 생각해봅니다. 사람 사는 일이 늘 그렇듯 꼭 즐겁고 기쁜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느 해처럼 때론 아프고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볼수록 커지는 것은 감사입니다. 특별히 제 세탁소를 통해 만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전 날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시 한편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 띄웁니다.
겨울 길을 간다
– 이해인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 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아는 이 하나 없다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화사한 봄도 아니고, 호사스런 여름도 아니고, 풍성한 가을도 아닌 텅 빈 겨울에 흰 눈 덮힌 오솔길을 걷는 시인은 올해 73살의 카톨릭 수녀입니다. 그녀는 아는 이 하나없이 별 빛조차 없는 어두운 겨울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겨울 길을 걷고 있는 시인은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녀가 행복한 까닭은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녀가 가슴에 품은 별이란 종교적 고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저 같은 보통사람들 누구에게라도 그 별 하나 묻을 가슴이 있는 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고운 별’ 같은 사람 하나쯤을 있지 않을까요?
이제 한 주간 남은 2017년의 당신의 시간들이 고운 별들로 반짝이는 길이 되시길 빕니다.
당신의 세탁소에서
The year 2017 has just one week left now. I’m thinking back over various things that happened this year. As is of the case with life, not all of them were happy and pleasant. Just like other years, some of them were painful, sad, upsetting or irritating. However, as I’m looking back over the year, what becomes bigger is gratitude. Especially, I am grateful to you who I got to know through my cleaners.
With the gratitude in mind,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one of my favorite poems on this morning one day before Christmas.
Walking on a winter path
– Hae-in Lee
Along with spring and summer
Woods which was dazzled,
When they take off clothes slowly with autumn,
Desolate at sunset
The sounds of winter coming are whistling around.
When I open the window casually,
On the snow-covered footpath,
Darkness becomes deeper and no one who I know is there.
In the winter woods without stars
There is no one that I know.
Thirsty from a long journey
Happiness of poverty, a beautiful star
Burying in my heart,
I’m walking on a winter footpath in the woods.
Not in cheery spring, not in dazzling summer nor in abundant fall, but in desolate winter, the poet who is walking on the snow-covered footpath is a Catholic nun at the age of 73. She is walking on the dark winter footpath in the woods without stars.
If we look at her with the eyes of ordinary people, the poet may look pitiful and sad. But, she declares the reversal which is shocking to ordinary people like me. She says that she is a happy person.
The reason why she is happy is because she is walking <on a winter footpath in the woods/Burying in my heart/Happiness of poverty, a beautiful star>. The star which she buries in her heart may mean religious confession.
But, thinking it over deeply, to all the ordinary people like me, if we have a heart to bury that star in, I think that we must have at least one person who is like a beautiful star which brings happiness to us. Don’t you think so?
I wish that the last week of 2017 will be like a path sparkling with beautiful stars to you.
From your clea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