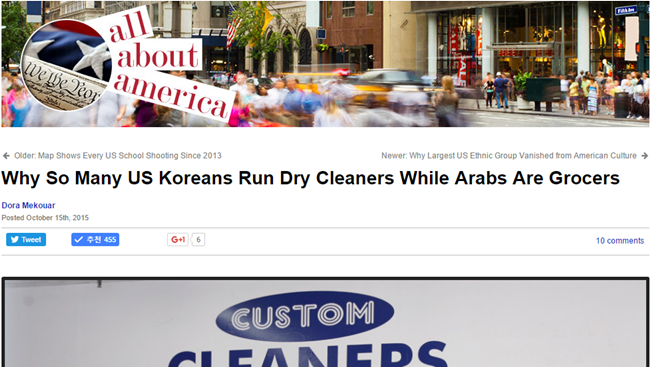엊그제 손님 한 분이 신문 한 장을 전해 주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었다. 그가 읽어 보라고 준 기사의 제목은 “고전하는 세탁소 가격인상 마땅(Struggling Dry Cleaners Are Forced to Lift Prices)”이었다.
기사가 전하는 내용들은 내게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내가 익히 경험으로 아는 사실들이기 때문이었다. 세탁소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 – 일테면 행어, 폴리백 등-의 가격과 개스 전기료 등이 턱없이 뛰어오른 현실은 비단 세탁소에만 국한 된 일은 아니지만 최근 그 인상 폭은 전에 경험에 보지 못한 정도이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자가 급증하고, 캐쥬얼 의상을 주로 입는 사회적 변화는 세탁소가 고전하는 치명적 요인들이 되었다. 더하여 일할 사람들 구하기가 어려워 올라 간 종업원 임금도 세탁소 하기 힘든 한 요인이 되었다.
기사의 내용들이었는데 모두 내가 이미 겪고 있는 일들이다.
또 기사에 따르면 펜데믹 이후 미국내 세탁소들의 약 30%가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는 것인데 이 또한 내 주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기사를 마무리하는 미주리주 한 세탁소 여주인의 말이다. “세탁료 인상? 내가 어쩌겠어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걸요.”
힘든 게 어디 세탁소 뿐이겠나? 미주리나 내가 사는 델라웨어나 크게 다를 바 없듯, 세상 어디나 이즈음 거의 한 흐름으로 돌아가는 형편이니 그저 나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거의 엇비슷 할 터.
그나마 내 걱정 해주며 ‘너도 가격 올려서 버텨 보라!’고 신문 한 장 건네 주는 손님 한 분 있어 한 주간 일의 피로를 덜 수 있는 기쁨에.
삶에…… 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