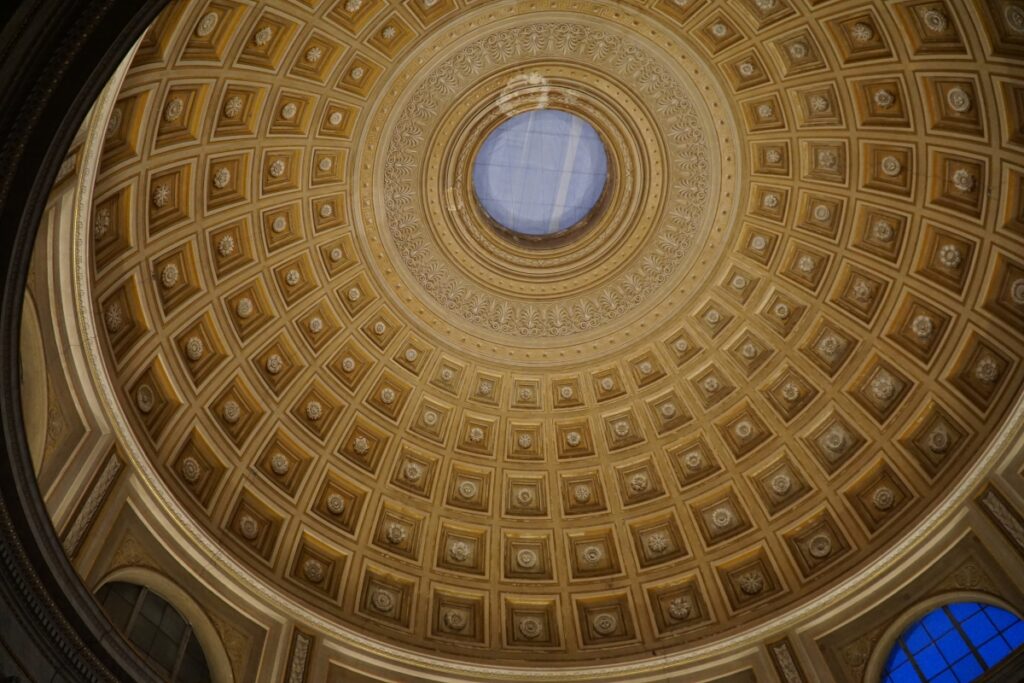바티칸 박물관(Musei Vaticani)은 지나치게 과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어쩜 이번 여행 내내 곱씹어 본 사람살이 모습이었지만 종교, 정치,경제, 과학, 문화 이즈음엔 스포츠까지 모든 영역에서 권력이란 예나 지금이나 너무 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잠시 하였었다.
그 어마어마한 전시물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 재력과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부질없는 생각이 오갔지만 박물관을 도는 내내 떡 벌어진 내 입을 닫지 못한 채 구경에 빠졌었다. 안내자 Alfredo는 전시물들과 교황청 또는 바티칸을 설명하면서 꼭 ‘우리(We)’ 또는 ‘우리의(Our)’ 라곤 했는데, 그게 또 내겐 제법 권위적으로 다가오곤 했었다. 족히 180센티를 넘었을 녀석의 키와 몸매 그리고 잘 생긴 얼굴도 녀석의 안내에 신뢰를 더하기도 했을 터였다.
모두가 다 허상인 줄 알면서도, 무릇 모든 권위와 그에 대에 허상은 ‘혹’하는 터무니없는 믿음의 크기를 더하는 법일게다.
그렇게 박물관 구경을 하다가 다다른 마지막 장소는 시스티나 성전 (Aedicula Sixtina)이었다. 안내자 Alfredo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절대 사진을 찍지 못하고요. 말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그저 조용~”
박물관 뜰에서 설명을 들었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의 천장화가 있는 곳, 물론 조용하라는 것은 그 보다 더 종교적 의미를 더했기 때문이었겠지만…. 그 너른 성전 안엔 이미 사람들이 차고 넘쳤었다. 그리고 조용히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들…. 그 소리들의 크기가 조금씩 더해지자 어디선가 낮고 묵직하게 들리는 소리, ‘쉬잇~’. 그 소리에 성전 안은 잠시 고요한 듯 하더니만 이내 다시 웅성웅성, 그리고 다시 ‘쉬잇~’, 조용, 웅성웅성이 되돌이표 처럼 이어졌었다.
이젠 내 나이 탓인지,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곳에 있으면 갑자기 멍해지며 졸음이 오가나 어지러운 증상이 오곤 한다. 그 순간 또 그런 증상이 밀려왔었다.
나는 사람들이 뜸한 성전 맨 뒤쪽 어느 문 앞에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금줄을 쳐 놓은 곳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다 금줄을 쳐 놓아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문이 열리더니 사제복을 입은 내 또래 사내가 미소년 세 명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왔다. 사제복 사내(노인이 맞겠다)는 한참을 미소년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더니(내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였기에) 이내 문을 다시 열고 그 안으로 사라지려 했었다. 나는 신기하기도 했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도 몰랐기에 그저 호기심으로 그들을 바라 보고 있었고, 금줄을 넘지 않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내 몸을 숙여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 사제복 사내가 나를 바라보며 이리 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잠시 멍해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사내는 내게 다가와 내 소매를 끄는 것이었다. 잠시 멈칫 거리고 있는데 안내자 Alfredo가 어느새 다가와 ‘With him!’하고 속삭였다.
그렇게 그를 쫓아간 곳은 텅 빈 거대한 응접실 같은 방이었고, 그곳엔 사진으로만 보았던 건장하고 젊고 멋진 바티칸 근위병이 조각처럼 서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 그 구경을 하고 성전 안으로 돌아온 내게 Alfredo는 내게 말했었다. “어휴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보내요. 그 문 안으로 들어 가려다 쫓겨나는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초대 받은 사람을 보기는 오늘 처음이네요. 거긴 교황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저 내 호기심을 가여이 여긴 은총으로 잠시 바티칸 시민이 되었었다는….
나 같은 속인이 단지 호기심으로 이른바 성전에 발도 디뎌 보았다는….
하여 성(聖)과 속(俗) – 그 여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