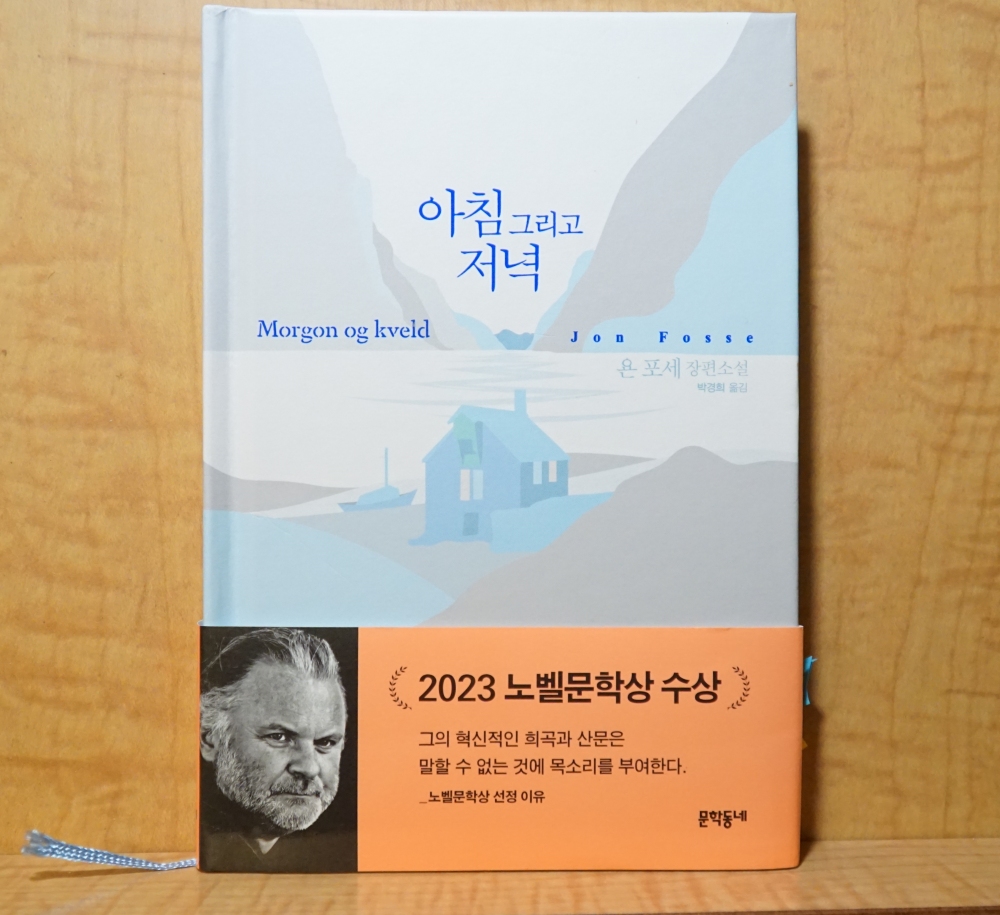종종 신비로운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오늘 같은 날이다.
1.
아침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마주친 것은 호주에 계신 홍길복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설교문이었다. 은퇴후 그가 행한 <죽음 – 제 3의 이민>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설교문 중 하나로 <끝이 좋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양 옆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야기를 주제로 한 설교였다. 설교문의 마지막 문단 중 몇 개의 문장들이다.
<인생의 마무리는 죽음입니다. 잘 죽어야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죽기를 바랍니다. 끝내기를 잘해야 합니다. ……. <유종의 미>를 영어로는 Crowning glory, <면류관을 쓰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맨 나중에 웃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최고 정점, 최대의 peak time은 죽음입니다. 죽을 때 잘못 죽으면 일생을 망치게 되고, 죽을 때 아름답게 마무리 하면 그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지만 끝이 나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죽음의 순간을 가까이 대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갑니다> 찬송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2.
오전엔 아내가 읽어 보라고 권한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가 쓴 장편소설 <아침 그리고 저녁>을 손에 들었다.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라며 아내가 건네 주었던 책인데 그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내 독서목록에서 밀려 있던 책이었다. 무슨 수상자나 수상작품이라는 치장이 달린 글들은 내게 썩 다가오지를 않는다.
말이 장편이지 고작 135쪽일 뿐인 중편으로도 짧은 축이었다. 그저 잠시 훑을 요량으로 들었던 책인데 책장을 덮을 때까지 엉덩이를 떼지 못하고 단숨에 읽어 내린 마치 단편 같은 소설이다.
소설은 주인공 요한네스가 태어나던 날 몇 시간과 그가 죽던 날 하루에 대한 기록인데 그의 할아버지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오대에 걸친 이야기들이 녹아있다. 하여 단편인 동시에 장편이다.
생명의 탄생에 대한 두려움과 신비로움으로 시작하는 소설은 죽음의 일상성이랄까 죽음이란 마치 평범한 삶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겪는 일 가운데 하나의 과정인 듯 이야기한다.
요한네스를 다음세상으로 데려가기 위해 잠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 먼저 죽은 그의 절친 페테르가 전하는 다음세상을 설명하는 말이다. <자네가 사랑하는 것은 거기 다 있다네. 사랑하지 않는 건 없고 말이야>
3.
오후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뵙다. 나를 보자마자 하시던 말씀.
“아이구, 내가 너를 기다렸어요. 이제 내가 떠날 준비를 해야되요. 내 장례식때 말이야… 니 엄마가 해 준 한복을 입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오줌 눌 때 아주 불편할 거 같애서… 그냥 양복하고 …여름철 거든 겨울철 거든 철은 따질 거 없어요…. 그거 입히고 니 엄마가 해준 반코트 있어… 그거 좀 입혀 줘.”
이즈음 들어 많이 오락가락하시는 아버지의 부탁이었다.
날은 여전히 쌀쌀한데 햇볕은 아주 따스한 날이다. 내 뜰에는 어느새 수선화 튜립 등이 싹을 틔어 오르고 크로커스는 이미 활짝 웃고 있다. 보라색 크로커스의 꽃말이란다. ‘누군가를 후회없이 사랑한다’라던가….
살아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사랑하고 볼 일이다. 그게 가는 날까지 천국에서 사는 일이고, 떠나서 만나는 이들은 어차피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이기에.
죽음을 논하는 아침에서 삶을 노래하는 저녁까지…
오! 이 신비한 하루에 감사.
홍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내일을 위하여….
내 쉬는 날 일상의 하나… 오늘은 달콤한 사과빵을 만들어 아내에게 맛보이다.